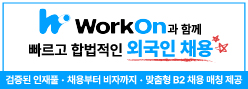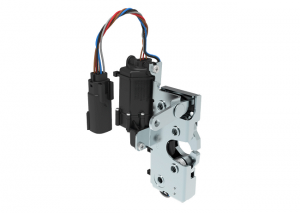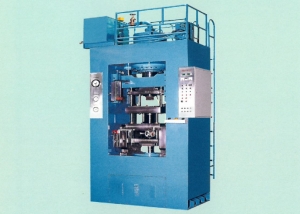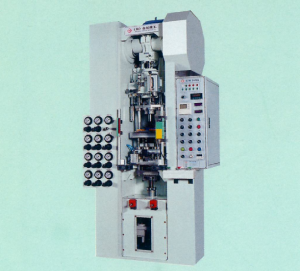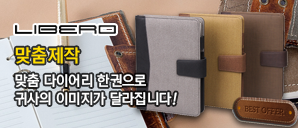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기획 연재 : 금형인 명예의 전당>
불모지에서 성장한 금형산업,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 - ②
인물로 보는 한국 金型史- 류제구 박사, 이하성 교수 편
한국정밀기기센터(FIC)에 스카우트 되면서 본격적으로 ‘금형수업’시작
막 성형공장일 끝내고 돌아온 청년 이하성은 피곤한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며칠 전 받은 스카우트 제의에 회사 일을 그만둘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대로 회사에 남아 있기에는 회사사정이 너무 열악했다. 스카우트 제의는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다. 결국 그는‘결정’을 내렸다.
이하성이 내린 결정이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시 우리 공업사를 다시 되돌아보자. 국내에서 금형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소규모의 가내공업용 설비를 갖추고 선진국에서 수입한 금형을 수리하거나 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도면을 가지고 생활용품 금형을 제작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범용 공작기계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외국산 금형을 모방해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게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통계에 따르면, 1960년도 이전에 설립된 금형업체는 65개사에 불과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에 힘입어 1970년도에는 173개사로 증가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자공업 및 중화학공업이 발전 되면서 정밀가공용 공작기계가 도입되어 프레스 금형과 플라스틱 금형 등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
“5.16 이후 국가재건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공장이라고 있어 봐야 설탕 만드는 공장, 밀가루 빻는 공장, 신발 만드는 공장… 그런 것들만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구, 부산 중심으로만 있을 정도였고 대부분 지역에는 공업이랄 게 별로 없었어요. 알다시피 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라 섬유나 가발 수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수출하려면 비행기 하나 채울 정도도 안 됐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중화학공업 육성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부가 외국에서 자금 끌어다가 지원을 해가면서 기계, 전자산업을 육성하게 된 거죠, 창원에 기계공업단지를 만들고 여러 지역에 있던 규모있는 공장들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창원이 마침내 기계공업의 중심지가 된 거죠. 거기에 파생적으로 생겨나는 공장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면서 공업화가 시작됐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방위산업이 있었어요. 소총, 탱크, 장갑차, 발칸포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외국의 선진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게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죠.

다행히 그때 건설에서 돈을 번 정주영 회장이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자동차를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 공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1, 2, 3차 벤더들이 따라 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 만 개 공장이 활성화되면서 기계공업이 일어난 거죠.”
이 교수의 회고처럼 일련의 기계공업 발달 과정은 금형 공업의 태동으로 이어졌고, 이 교수 자신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단초가 됐다. 당시 상공부(산업자원부의 전신, 지금의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정밀기기센터(FIC)에 서 이하성의 재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를 한 것이다.
한국정밀기기센터는 1966년 4월 UNESCO와의 협력으로 국내 최고의 특수 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만든 기관이었다. 한국정밀기기센터는 1979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개편되었고, 이하성 교수는 1980년까지 이곳에서 기술훈련부 교수로 재임했다.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는 이후 한국기계연구소를 거쳐 지금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성형업체에서 근무하다 FIC에 스카우트 돼 그쪽으로 불려갔죠. FIC는 어떤 곳이냐면 기계연구소의 전신으로 유네스코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곳에서 정밀가공, 정밀측정, 치공구, 공정설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밀관련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죠.”
이 교수는 이곳에서 본격적인‘금형 수업’을 받게 된다.
출장 도맡아 다니며 배운 내용 업체에 다시 교육시키던 시절
1978년 어느 날. 허겁지겁 경남 양산으로 출발하는 차에 올라탄 이하성은 가쁜 숨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 번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가방 안에는 밤새 정리한 질문거리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이걸 다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떻게 가르친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 잡은 이하성은 가방 안에서 서류를 꺼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 서류는 방위산업체 기업들의 기능요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정리한 교육 계획서였다.
당시 불기 시작한 방위산업 육성 붐은 이 교수의‘금형 수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다.
사회도, 경제도 모든 게 무(無)에서 시작하던 때였다. 말이 좋아‘교수’였지 행정요원 역할까지 해야 했고, 지방 출장은 도맡아 다녀야 했다. 현장에서 배운 걸 다음 날이면 업체에 나가 가르치는 그런 생활이 반복됐다. 모든 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국가사업에 일조한다는 자긍심과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재미가 그 힘든 시절을 견디게 했다.
“방위산업체 교육 계획을 세우고,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을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경남 양산에 국방부 제조병창이 있었는데 거기 공장에 주로 파견 나가 있거나 계속 출장을 다녔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와서 그걸 다시방산 업체에게 접목하는 식이었죠. 그런데 교육을 하려면 내가 설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부턴 질문거리를 한 보따리 싸서 내려갔어요. 출장은 거의 도맡아 하면서 선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죠.”

방위산업 육성은 기계공업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됐고,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숙제를 낳게 된다. 방위산업과 기계공업의 발달은 금형교육에 어떤 형향을 미쳤을까? 다시 이교수의 증언을 들어보자.
“방위산업 초창기에는 금형이 그렇게 큰 필요가 없었어요. 방산에서 금형을 사용하는 비율보다는 오히려 치공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어요. 70년대에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도 대부분 공정 설계하고 치공구 설계, 정밀가공쪽으로 이뤄졌어요.
그런데 민수품도 대량생산 되면서 70년대 중후반부터 실질적으로 금형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79년 중소 기업진흥공단에서 조사한 전국 금형산업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에 400여개 공장이 있었는데 양산 체제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숫자가 5년 단위로 거의 배증했어요. 400 개가 800개가 되고, 다시 1,600개, 3,000개, 5,000개, 6,000개까지 늘어나다 보니 설계, 제작 쪽 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시기가 왔죠.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 금형인력이 양성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치공구 교육도 시켜야 하지만 전문대학에서 금형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80년대 들어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에서 금형관련 학과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여기까지가 이하성 교수의‘금형 인생’1막이었다면 본격적인 2막은 유한공업전문대학(현 유한대학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류제구 박사와의 인연도 본격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다음 호에는 류제구 박사의‘금형 인생’을 중심으로 우리 금형역사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4년제, 2년제 대학의 금형학과 개설 과정과 이하성 교수와의 본격적인 인연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