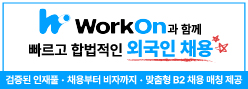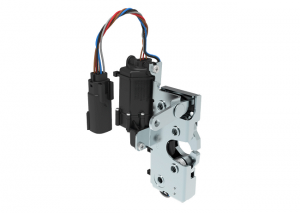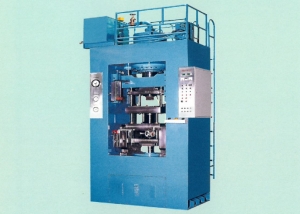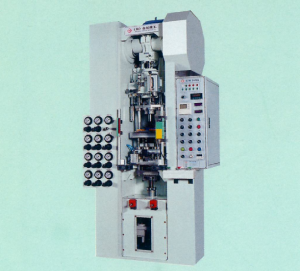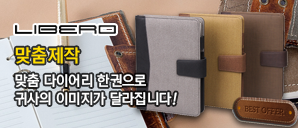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기획 연재 : 금형인 명예의 전당>

불모지에서 성장한 금형산업, 미래는 교육에 달렸다 - ①
인물로 보는 한국 金型史- 류제구 박사, 이하성 교수 편
격랑의 시대를 헤쳐 온 선배 금형인들의 삶 속에는 우리나라 경제사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그분들의 삶 자체가 바로 한국 금형사의 살아 있는 생생한 역사인 것이다.
《월간 MOLD》는 이런 선배 금형인들을 기념하기 위해 <금형인 명예의 전당> 연재를 시작한다.
<금형인 명예의 전당> 기획 연재 기사는‘인물로 보는 한국 金型史’로, 도전정신과 희생정신으로 국가경제와 금형산업성장을 견인해 온 선배 금형인들의 삶을 재조명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기획된 코너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 금형교육의 개척자이자 산증인인 류제구 박사(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품설계금형공학과 교수)와 유한대학교 금형설계과 이하성 교수를 모셨다.

1984년 경기공업개방대학(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세계 최초로 4년제 정규 금형학과를 신설하는 데 크게 기여한 류제구(1945년생) 박사. 이에 뒤질세라 한 해 뒤인 1985년 유한전문대학교(현 유한대학교)에 금형설계학과를 신설한 이하성(1951년생) 교수. 이 두 사람은 우리나라의 금형교육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다.
류제구 박사는 한국금형공학회 창설(2006년)을 주도해 초대회장을 역임하고, 명예퇴직 전까지 27년간 2,100명의 후진을 양성해 금형업계에 배출했다. 지금도 유한대학교에서 후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4시간씩 강의를 할 정도로 세월을 잊은 채 살고 있다.
금형공학회 탄생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맡았던 이하성 교수는 류제구 박사의 뒤를 이어 2, 3대 회장을 맡으며 학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명예퇴직한 류 박사를 모셔와 후학들에게 그의 소중한 지식을 전수하게끔 한 것도 이 교수였다. 이 두 사람을 연결하고 있는 끈은 바로‘선진화 된 금형교육의 완성’이라는 목표일 것이다. 이 들의 삶 속으로, 우리 금형산업의 역사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본다.
이하성 교수, 제대 후 성형공장에 입사하면서 금형과 첫 인연
<현재 금형관계 기능 인구는 전국을 통틀어 약 오백 명. 지난 3월말 현재 노동청의 기능검정에 합격한 금형공은 1급 1명, 2급 2명, 4급 21명 등 모두 이십사 명.
한양공대를 나와 금형 공교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중앙직업훈련원 기계과 주임교사 신근하씨는“금형공을 길러낼 교사 요원부터 확보가 안 된 상태”라면서“기업체로부터 교사라도 좋으니 보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으나 사람이 없어 못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처의 기능공 장기 수요예측에 따르면, 금형공은 81년말 까지 3만 6천여 명이 필요하나 현직 금형공의 수는 우선 금년 한 해 동안의 수요예측 1,961명의 4분의 1도 못된다.>
국내 금형기술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룬 1974년 8월 27일자 동아일보 기사의 일부다. 바로 1년 전,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군대생활을 하던 청년 이하성이 제대 후 맞닥뜨린 당시 국내 금형산업의 현실은 이렇게 암담했다.
이하성과‘금형’의 첫 인연은 제대 후 시작됐다.
“76년도에 제대하고 나서 성형품을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철공소에서 금형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걸로 성형품 만드는 그런 회사였죠. 그때는 금형이랄 것도 사실 없었어요. 진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반이나 밀링으로 잘라서 볼트로 체결하는 것도 아니고 용접해서 붙이는 그런 시절이었죠,”
1951년생인 이하성 교수는 인천 출신이다. 인천은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에서 적잖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 교수가 기억하는 인천의 기계공업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 금형산업의 역사와도 닿아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공업의 역사는 제대로 성숙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운영되던 군수공장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6.25로 그나마 있던 공장들도 다 부서지고 남은 공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인천에 한국기계라고 있었는데 일제 때 조선기계제작소로 불리던 곳입니다. 그걸 김우중씨가 맡게 됐는데 60년대 후반에 대우중공업으로 바뀌면서 그게 한국기계공업의 효시처럼 됐지요. 그렇게 해서 인천이 어떻게 보면 기계공업이 시작된 도시가 됐어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우중공업, 한국유리, 이천전기… 이런 큰 공장들이 하나 둘씩 들어서면서 공업화가 시작됐지요.”

60년대 중반만 해도 한국에서 금형 만드는 건 시기상조라고 여겨
70년대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지내며 경제개발 계획을 주도했던 오원철씨가 기억하는 금형과 관련된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있다.
1966년 4월, 오원철씨가 박충훈 당시 상공부 장관과 동경에서 열린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총회에 참석했을 때 일이다. 재일교포인 공영화학(共榮化學)의 김종수(金鐘壽) 사장이 찾아와서 공장 시찰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 일행은 동경에서 좀 떨어진 중소도시로 갔다. 공장규모는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김 사장은“플라스틱 공업에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금형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책상 만한 쇠뭉치를 손으로 가리키며“이것이 정밀해야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값이 엄청나게 비쌀 뿐 아니라 제조기간이 무척 깁니다. 금형 제작이란 사람의 손길이 많이 가는데, 일감이 밀려 1년이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이“한국인의 손재주가 세계 제일인데, 한국에서 만들어 가면 될 것 아니오?”하고 물었다.
김 사장은“한국에서 금형을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금형이란 소총이나 기관총 만드는 정도의 정밀성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한국 노무자는‘시아게’가 부족합니다.”라고 했다.
시아게(仕上)는 끝손질, 마무리를 뜻하는 일본말인데, 단순한‘마무리’가 아니라‘완벽하게 일을 끝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시아게’정신이 부족해서 플라스틱 금형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김 사장의 설명이었다. 이 때 오원철씨는‘적당주의로는 정밀공업을할 수 없겠구나!’하고 느꼈다고 한다.
당시에는 김 사장의 말처럼‘시아게’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몇 년 후 세계기능경진대회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금메달을 따냈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