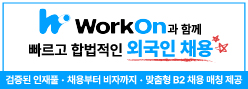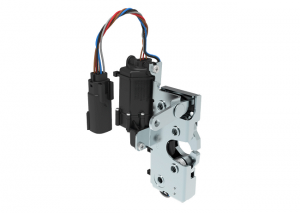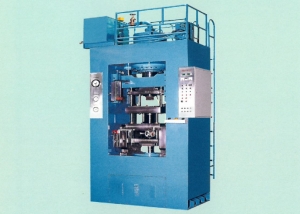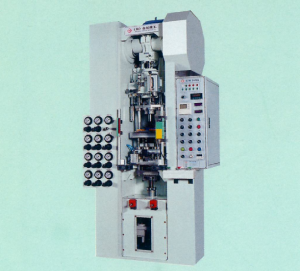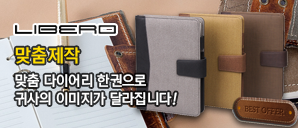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레이저 앤 포토닉스 리뷰(Laser & Photonics Reviews, IF 10.0)’ 10월 7일(화) 내부 표지 / 사진.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박재형 교수 연구팀이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이하 AR) 환경의 사실감을 크게 높인 폐색(Occlusion) 기반 홀로그래픽 AR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광학 분야 권위 학술지인 ‘레이저 앤 포토닉스 리뷰(Laser & Photonics Reviews, IF 10.0)’ 10월 7일(화)자 내부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폐색 광학 시스템을 결합해 AR 환경의 자연스러움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불투명한 3차원 가상 영상과 광학적으로 형성된 가상 그림자를 구현함으로써, 가상 영상이 실제 환경의 물체와 상호작용하는 시각 효과를 재현했다.
또한 AR 환경의 영상이 전체 공간이 아니라 가상 객체 주변에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해, 희소(Sparse) 홀로그래픽 영상 구현에 최적화된 AI 기반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PSNR(신호 대 잡음비)을 평균 11㏈ 향상시키며 영상 품질을 크게 높였다.
AR 글래스는 스마트폰을 잇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주목받고 있으나, 현재 상용 제품들은 폐색 효과를 구현하지 못해 가상 영상이 실사 객체를 자연스럽게 가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사람이 깊이를 인지하는 핵심 단서인 폐색 효과가 결여되면, 가상 영상이 실제 세계와 반투명하게 겹쳐 보여 사실감과 몰입감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기존 AR 글래스는 양안 시차에만 의존해 3D 영상을 구현하기 때문에, 단안 초점 정보와 불일치하는 ‘초점 조절-융합 불일치(Vergence-Accommodation Conflict, VAC)’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사용자가 피로감이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근안 디스플레이 상용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연구계에서는 실사 세계의 빛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폐색 광학계를 도입하거나, 홀로그래피·라이트필드·가변 초점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 시도돼 왔으나, 폐색 효과와 3D 영상 구현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박재형 교수팀은 홀로그래픽 AR 디스플레이와 광학 폐색 시스템을 단일 구조로 통합해 현실적인 AR 환경을 구현했다. 연구진은 기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의 잡음을 제거하는 4f 시스템 기반 푸리에 필터 구조(Fourier filter structure)가 폐색 광학 시스템과 동일한 형태임에 착안했다. 이에 단일 Digital Micromirror Device(이하 DMD)를 푸리에 필터와 폐색 마스크로 동시에 활용하고, 시간 다중화 기법을 통해 폐색과 노이즈 제거를 한 시스템에서 수행했다.
또한 DMD의 다이내믹한 제어 특성을 AI 기반 홀로그램 생성 알고리즘에 반영함으로써, 탐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축소하고 희소 홀로그래픽 영상의 품질을 크게 개선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적용해 벤치톱 프로토타입(Benchtop Prototype)을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 배경을 광학적으로 가리는 불투명한 3D AR 영상을 재현했다. 더 나아가 폐색 효과를 이용해 가상의 물체가 현실 세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장면도 구현해, 기존 AR 환경 대비 명암비와 선명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이번 연구는 가상 영상이 실제 환경의 빛과 상호작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AR 구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특히 가상 물체가 현실 세계의 빛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고 그림자를 드리우는 자연스러운 AR 시각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몰입형 디스플레이 응용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존 홀로그램 생성 최적화 방식에서 벗어나, 다이내믹 푸리에 필터를 알고리즘 구조에 직접 통합했다는 점에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의 공동설계라는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AI 융합 기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박재형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가상 영상이 실제 환경의 빛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AR 구현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며, “앞으로도 광학과 AI의 융합 연구를 통해 보다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시각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