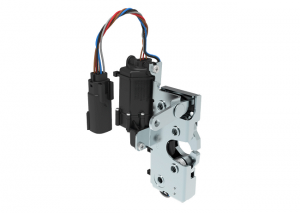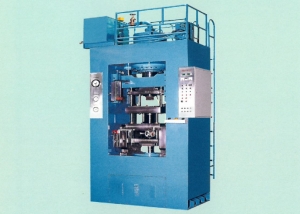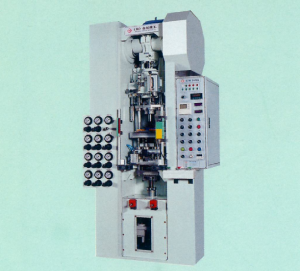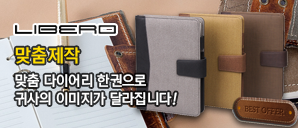위너스오토메이션 (대표 김춘호)이 지난 9월 3일, 한국도심공항터미널 소노펠리컨벤션에서 ‘ 2025 자동화기술동향포럼 ’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위너스오토메이션은 최근 산업현장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과 함께, 산업자동화 선두기업인 로크웰오토메이션 (Rockwell Automation), 시스코 (Cisco), 리탈(Rittal), 벨덴-프로소프트(Belden-Prosoft)가 제공하는 스마트제조 환경 구축에 필요한 최신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원프레딕트 대표이사이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인 윤병동 교수의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Beyond Manufacturing(제조를 넘어선 제조 AI 혁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이안의 조규민 부대표의 산업 분야의 디지털 트윈의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백효인 팀장은 로크웰은 전형적인 산업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AI가 외부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생산시스템을 통합하는데 방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AI 도입은 일반적인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제조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취재 최교식 기자 cks@engnews.co.kr>
위너스오토메이션 김춘호 대표 환영사

위너스오토메이션 김춘호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 AI, 디지털 트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위너스오토메이션 김춘호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는 산업 AI, 디지털 트윈이 필수이며, 산업 AI와 디지털 트윈은 지속가능한 제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트윈은 가상모델링, 시뮬레이션, 최적화로 생산성을 30%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밝혔다.
또, 국내기업의 도입현황을 보면 10개 사 중 4개 사가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이 사례는 대기업이 65%, 중소기업이 35%, 중견기업이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AI 도입의 효과 및 활용사례는 생산성 향상, 운영비용 절감, 의사결정의 정확도에 있다고 말하고, AI는 연구개발(R&D), 공정최적화, 시장예측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너스오토메이션은 로크웰과 시스코, 리탈, 프로소프트의 글로벌 협력파트너십 관계에 있으며, 이 4개사를 중심으로 영업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용하 대표 환영사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용하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춘호 대표에 이어 환영사에 나선 로크웰 오토메이션 이용하 대표는 이전의 자동화는 수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해왔지만, 최근 AI가 도입됨으로써, 이전의 모델을 탈피해서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이처럼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위너스오토메이션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에 가장 합당한 파트너라고 피력했다.
위너스오토메이션 손완호 영업총괄 부사장 사업 소개

손완호 위너스오토메이션 영업총괄 부사장이 위너스오토메이션의 사업소개를 하고 있다.
이어 손완호 위너스오토메이션 영업총괄 부사장이 위너스오토메이션의 사업소개를 진행했다. 위너스오토메이션에는 총 7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부와 영업부 인원이 비슷한 것이 특징으로, 이 의미는 많은 고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위너스오토메이션은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회사라고 역설했다.
지난 2024년 7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는 85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손 부사장은 위너스오토메이션은 2028년까지 큰 성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 남고 싶다고 피력했다.
위너스오토메이션은 로크웰 오토메이션을 위주로. 컨트롤러, 모션, MCC(지능형 모터 컨트롤 센터)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
특히 프로소프트 게이트웨이도 많은 판매를 보이고 있으며, 위너스오토메이션은 대부분의 통신 게이트웨이는 갖추고 있고, 리탈 판넬의 가장 큰 대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리탈의 판넬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스코 스위치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다.
또한 스트라투스(Stratus)의 컴퓨터 이중화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스트라투스의 컴퓨터 이중화는 국내에서는 철도청 신호제어 시스템에 많이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위너스오토메이션은 도면, 시공, 시운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윤병동 원프레딕트 대표이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기조연설

윤병동 원프레딕트 CEO는 우리가 잘 하는 버티컬 AI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원프레딕트 대표이사이자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인 윤병동 교수는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Beyond Manufacturing(제조를 넘어선 제조 AI 혁신)을 주제로, 제조업에 적용되는 AI 기술과 다양한 사례를 전달했다.
윤 교수는 AI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하고, 2000년에 글로벌 500대 기업 CEO를 대상으로 AI가 우리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당시에는 27% 정도였던 것이, 최근 모 글로벌 컨설팅 회사 조사에 따르면 90%가 넘었다고 설명하고, 불과 5년 사이에 글로벌 500대 기업 CEO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면서, AI는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제조분야에서 AI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가 이날 발표에서 강조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조를 뛰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에 우리가 영위해오던 제조의 사업영역을 뛰어넘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AI가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제품을 수입해가는 기업들에게 왜 우리나라 제품을 사가가는지 질문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 납기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윤 교수는 이것이 30~4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을 이끌어왔던 원동력이었지만, 이걸로는 더 큰 성장을 이뤄내기는 어려우며, 이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까지 3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어려우며, 산업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산업에서 기존의 자동화를 넘어, AI 기반의 완전한 자율 제조 패러다임을 구현해야 하며,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도메인의 전문성과 AI 기술의 결합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AI의 해석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환경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데이터 처리 기술과 AI 모델링 역량이 요구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 제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서 할 수 있는 파괴적인 혁신은 무엇인가? 자율화다. 자율화의 뜻은 AI를 활용해서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해서, 설비 스스로 지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율화의 핵심은 결국은 AI다.
우리나라는 제너럴 AI에서는 승산이 없으며, 우리가 잘 하는 버티컬 AI에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버티컬 AI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잘 작동하는 AI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 매뉴팩처링 AI, 헬스케어 AI 등이다. 제너럴 AI 시장은 40%에서 50% 정도 버티컬 AI보다 크지만, 우리가 잘 하는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면 그 시장만큼은 글로벌에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인 자율성의 예에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자율주행과 자율제조다. 자율제조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가 되는 것이다.
올해 30여 개 기업의 제조라인을 직접 가봤는데,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하나씩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보다 객관화돼서 데이터 기반의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업무 생산성이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고도 나와 있고, 속속 증명이 되고 있다. 결국은 제품에 자율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인력의 문제, 업무 생산성의 문제, 데이터의 문제 때문이다.
제조라인에 가보면 최근에 서버룸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고, 통신량도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얘기를 해보면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 데이터는 많이 얻고 있는데, 쓸만한 데이터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AI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데이터가 원시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AI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라인에 자율성이 들어와야 한다. 지각의 기능, 사고의 기능, 행동의 기능이 들어와야 한다.
지각의 기능을 보면 멀티모달 데이터를 일단 자율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 데이터를 올려줄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데이터에 대한 생애주기관리가 필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측기 설계와 서로 가상계측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영역으로 보면 제조라인에서는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AI 데이터의 지식과 도메인 지식 또는 물리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사전학습을 할 수 있으면 유리하다. 설명 가능한 AI가 나와야 되고 적은 량의 데이터도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나와야 된다. 생산 쪽에서는 메인터넌스가 됐든 에너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태스크에 매뉴팩처링 AI가 같이 들어와서 업무를 표준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작업지시서나 작업보고서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야 되고, LLM 기반으로 사용자들과의 HR창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만든 많은 AI 모델에 대한 모델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안 조규민 부대표 기조연설

이안의 조규민 부대표가 산업분야의 디지털 트윈의 실제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윤 교수에 이어서 산업 AI와 디지털 트윈기술 인사이드 아웃을 주제로 이안의 조규민 부대표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조 부대표는 최근의 국내외 트렌드 변화와 향후 전망 등 기술과 사례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안은 산업용 AI 융합기반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주력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15년 동안의 업력을 통한 다양한 경험치를 확보하고 있다.
조 부대표는 디지털 트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산업현장에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이란 존재하는 실재를 디지털로 쌍둥이를 만드는 것이다. 목적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쓰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가 결정되지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기술들은 왜 만드나, 무엇이 목적이냐에 연결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디지털 트윈을 왜 만드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예측이라는 부분들, 자율화를 위한 예측도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리 대처하기 위한 예측도 있을 수 있고, 최적화를 위한 예측이 필요하다. 즉,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측이 필요하다.
예측을 하려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조건을 놓고, 조건대로 가상으로 동작을 시켜보고, 실험, 시뮬레이션하고 이 결과를 참고해서 물리적인 실체에 의사결정 데이터를 넣고 변경을 가하고, 검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험적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미래시제에 대한 것들, 실제에다 무엇을 해보기 전에 가상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해보고 검증해 볼 수 있다.
산업용 디지털 트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프로덕트이다. 자동차, 항공기, 드론, 반도체 칩과 같은 완성된 생산품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디지털 트윈의 요소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무엇인지 타깃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고, 제품을 형상, 속성, 동작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링 기술을 썼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의 디지털 트윈을 왜 만들었는가 생각해본다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이 제품의 성능을 높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선 제품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고, KPI를 설정해서 이 KPI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되는 단계가 있고, 기획 가설, 검증이 끝나면, 그 제품을 성능에 맞게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가 끝나면 설계대로 제작을 해야 되고, 제작이 끝나면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되면 사용이 되고, 사용이 되면 유지보수까지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당 디지털 트윈이 존재해서 원투원 고객관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비스생애주기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타깃으로 했는가? 프로덕트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에 맞는 기술과 그것에 맞는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이안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보통 프로덕트에 대한 디지털 트윈보다는 산업시설을 타깃으로 잡는다. 반도체공장, 디스플레이 공장, 자동차공장도 있고, 제조라인에 대한 제조시설도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발전 플랜트, 페트로케미컬 같은 석유화학 처리, 하페수 처리시설, 데이터센터나 물류센터 등 산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시설이 있다. 이 시설들을 직접적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산업시설을 먼저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려면 그 시설을 이루어내는 건축부터 안쪽의 설비까지 아우르는 3D 설계 데이터나 2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공간과 상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전생애주기를 바라봐야 된다. 새로운 공장을 짓기 전에 이 공장을 짓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들고, 어느 정도의 공사비용이 들고, 몇 대의 주요장비들과 보조장비들과 설비들을 배치했을 때 연간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수율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모두 기획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상으로 연출해보고, 데이터를 뽑아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부터 출발해서 이후에 원시데이터로 존재하는 설계데이터들을 통합해서 검증시키는 것부터, 또 완성된 설계대로 시공됐는가를 관리하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제조라인이면 제조가 돌아가고, 데이터센터면 운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운영단계에서도 모니터링부터 예측, 안전, 교육, 유지보수, 예지보전 같은 것들을 하나의 관통하는 스트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체계를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서, 각각 특성화된 기술을 반영하고 있는 기술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산업용 디지털 트윈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 전생애주기가 결국은 가장 화두가 된다고 본다.
산업시설을 타깃으로 했을 때는 전생애주기를 놓고 현재 고객사, 발주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기획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지어져 있는 공장이나 산업시설의 운영과정에서의 혹은 안전상황 등에 관심이 있는지, 관점에 따라서 투영될 수 있는 요소기술들이 있고, 이런 요소기술들을 플랫폼 위에 태워서 정확하게 구현된 공간 위에 이런 기술들을 잘 적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다.
산업시설을 디지털 트윈으로 정밀하게 공간 자체를 만들려면 2D 도면이나 3D 설계도 이런 설계데이터를 기반으로 반영하고 만들어낸 디지털 트윈 공간이 중요하다. 그런데 과거에 지어진 시설들, 또는 보안이나 여러 이슈, 설계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근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공장에 가서 물리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라이다 센서나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3D 스캐닝을 한다거나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그걸 기반으로 추가적인 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걸 통칭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토대로 물리적인 시설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정밀한 설계데이터 수준으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런 과정 또한 상당한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랜, 디자인, 컨스트럭션, 매뉴팩처링 혹은 오퍼레이션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바라고 있는 목표, KPI가 다 다른데, 기획단계에서의 지표를 산출한다거나 그리고 설계단계에서는 수많은 설계데이터를 하나로 통합시키고 용량이 커지는 것 때문에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량화, 설계 간의 검증, 충돌은 없는지, 다 만들어진 설계기반 공간 위에 추가적인 라인을 증설한다든지 하는 추가설계와 리어렌지에 대한 부분들, 설계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해 가면서 공사계획대비 비용과 일정대비 잘 진행되는지를 정확한 현장데이터를 취득해 비교해가면서의 시공공장 현황을 관리하면 시공 생산성을 높이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
운영상으로 가게 되면 실시간 모니터링, 제어, 유지보수, 예측, 예지보전, 그리고 새로운 라인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을 때, 미리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변경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더 나아지는 결과는 없는지, 이런 걸 찾아서 거기에 맞는 최적의 지표를 찾고 파라미터를 구한 다음에 물리적인 것에 반영을 하고, 실제 물리적인 변경 설치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별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을 만족하는 형태로 여러 산업 분야, 여러 기업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다.
공장을 설계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게 되면 검증된 공간 안에서 새로운 상황별 공간을 다시 연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학 반도체 라인에서 화학가스들이 흘러내리는 배관을 철거한다고 하면 단지 배관을 뜯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잔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양에 따라서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고 어떤 검사를 한 뒤에 철거하고,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절차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해볼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다양한 산업들의 필요한 기술들이 디지털 트윈의 모델링 엔지니어링 기술들 더하기 AI적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데, 공장의 제조라인을 구성하려면 제조장비나 제조설비에 대한 모델을 잘 매치해야 한다. 그 모델이 모양과 크기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작에 대한 것이나, 연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물리적인 모양과 크기만 여기다 배치를 해놓으면, 진짜 중요한 장비들을 여기다 어떻게 연결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장비들을 정확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장비는 설계데이터를 변환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계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반도체 장비회사들은 설계도를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이즈도 크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사진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서 다시 돌아와서 모델러가 제로베이스에서 사진을 봐가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모델링을 했다. 사진 한 장만으로 추론모델을 넣어서 생성모델을 통해서 3D 메시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넓은 단지에서의 수 많은 장비들을 역설계하는 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AI기술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AI 가속화 경량모델을 통한 변환,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적인 기술로 현재 검증돼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기술로만 봤을 때 산업 디지털 트윈, 퍼실리티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새로운 S사 반도체 팹 글로벌 공장이 지어질 때 건축구조물 안쪽에 배치되어있는 시설들, 전체 최상층에 있는 클린룸을 포함한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구조시설물 전체를 사전에 정밀하게 설계들이 구성이 되면, 이걸 가지고 여기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게 하는 상황으로 현재 십수년 째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상의 팹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유효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S사 디스플레이 공장의 경우도 동일하게 팹이라는 공장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통합 검증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주 제어실은 여러 역할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 제어실에서 위험성 평가나 사용성 평가를 토대로 원자력 관리의 실전적 측면에서의 문제들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해외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어내는 S전기 사의 해외공장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지보전, 경북구미산단에 태스크베드로 만들어낸 산단용 제조라인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그리고 S사 디스플레이나 H 등의 공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사와 공장 간의 원격협업 시스템들, 원격으로 접속하게 되면 현장에 나가 있는 작업자의 카메라에 비춰진 실사 영상과 디지털 트윈 3D 데이터를 합성해서 공간 안에서 체스 두듯이 이렇게 바꿔보자라는 의사결정을 원격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콜라보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구축되고 있다.
최근에는 H우주항공사의 항공엔진 조립공장에 대한 디지털 트윈도 적용이 완료가 돼서 특수한 조립공장의 외부환경에 대한 것들을 예지보전하는 부분들,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에너지 효율 디지털 트윈, 혹은 수냉식 시스템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AI 데이터센터의 경우에 수냉식 데이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최적화시키는 디지털 트윈, 이런 요소들이 요즘에 상당히 필드에서 적용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트윈을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상이 되는 물리적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다. 안 그러면 계속 가상에서만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데이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현장의 상활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나 3D 컨텐츠를 활용해서 연장해서 확장해서 AR 증강기술을 활용해서 현장에 나간 작업자들이 태블릿이나 글래스에 실어서 특정 장비의 상황을 인스팩션하거나 조치를 하는 데 사용하거나 하는, 수많은 장비와 수많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것에 맞게끔 증강 매뉴얼을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저장도구, 만들어진 매뉴얼 컨텐츠를 배포 유지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전체적인 운영 플랫폼, 이런 형태로도 제공을 하게 되면 수많은 상황들, 직무교육도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안전교육, 유지보수, 장애조치 등 대단히 많은 케이스들을 커버할 수 있다. AI 기반의 현장과 현장, 원격지 간의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고, 현장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원격 커뮤니케이션이나 원격협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러한 제조라인들은 규모도 크고, 국가보안시설급의 라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시간 네트워킹이 되질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갈 사람과 이걸 활용할 외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현장영상을 취득한 걸 영상을 올리면, 원격지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보안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다운 받아서 영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검증한다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넣는다거나 하는 형태로 상황에 맞게끔 제공을 하고 있다.
즉, 하나의 프로세스 라인이 쭉 흘러서 문제발견부터 문제조치까지, 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로 구현이 되고 있다.
좀 더 고도화된 기술로 가게 되면 물리적인, 특히 반도체 팹 같은 경우에 배관에 위험한 화학 가스들이나 진공이 왔다갔다 하는 수만 개 배관들이 있는데, 그 배관들이 생각보다 자주 교체가 일어난다. 그래서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현재 상태와 앞으로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교체가 일어날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고, 어떠한 흐름의 변화가 있을 건지를 미리 연출해보고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대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실제 물리적인 센서부터 CFD에 역학을 넣어서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메타모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배관압력에 대한 예측도 하고, 평가도 해서 전반적인 운영체게를 할 수 있는 것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중요한 화두로 보고 있다.
설계 데이터로 출발해서 해당현장에 있는 수많은 시스템과의 연계, MES나 PLM 같은 제조라인에서의 중요한 구조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과의 연계, 현장의 IoT 센서부터 OPC UA로 돌아가고 있는 모든 프로토콜이나 실제현장의 온습도를 포함한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종합적인 데이터 분류별로 취득하고 분석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의 서비스까지 확장됐을 때 결국에는 외형부터 내부적인 데이터의 움직임, 예측 이런 것이 한번에 가능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수많은 산업 분야 현장에서 적용되고, 검증되고 확산되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AI Powered 솔루션을 통한 자율제조의 실현-로크웰 오토메이션 백효인 팀장

AI Powered 솔루션을 통한 자율제조의 실현을 주제로 로크웰 오토메이션 백효인 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기조연설에 이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백효인 팀장이 제조업의 트렌드와 이에 대해 로크웰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백 팀장은 한 조사에 따르면 83%가 2025년 운영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소개하고, 생성형 AI는 향후 12개월 동안 신규기술 분야 1위에 위치하며, 이제 산업용 Generative AI는 전망에서 현실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팀장은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08억 달러까지 AI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조에 생성형 AI가 도입되면서 설계나 공정, 품질, 마케팅에까지 AI가 활용되고 있다. 또, 설명형 AI(XAI)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멀티모달 AI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면서, 사용자의 경험과 운영효율 향상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나 추론형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AI 도입에 대해서는 효율성 개선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다. AI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당연히 강조가 되지만, AI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제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솔루션이 도입되고 있지만, AI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있어서도 기술격차나 유형에 규격들을 보고 있다.
규격들은 실제로 제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새로운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해야 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경제성장 둔화가 기업들의 도전과제로, 기업들은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술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AI가 강조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제조기업이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의 1순위는 품질개선이다.
산업시스템은 디자인 단계, 운영단계, 유지보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제품이나 공정을 계획하고 이것을 시뮬레이션해서 검증한 다음에 제어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리고 실제 운영단계는 설계된 방식에 대해서 실제로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MES, 자재에 대한 물류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설계 단계, 운영단계에서 발생한 자산에 대해 관리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자산을 보호한다.
이런 각각의 설계, 운영, 유지보수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어져 있고, 하나의 사이클로 구성이 되어 있다.
로크웰은 이런 전형적인 산업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AI가 외부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형적인 생산시스템을 통합하는데 방점을 맞추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설계 파라미터값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에 대해 기존에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 수정하고 오류를 보완할 수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AMR 등을 통해서 자율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고,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예측보전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업지시서를 스스로 내려줄 수 있다고 하면 AI가 전형적인 생산시스템 안에서 자율제조를 위해서 개발이 된다.
이처럼 AI 도입은 일반적인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제조를 실현할 수 있다.
로크웰은 AI에 대한 본질적인 통합을 바탕으로 고객의 자율제조와 생산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자율제조는 어떠한 변수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연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로크웰은 전형적인 생산시스템인 설계, 운영, 유지보수라는 수평축과 엣지단부터 IT 영역에 이르는 수직축 AI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로크웰은 디자인, 운영, 유지보수(수평축), 엣지와 클라우드(수직축)까지 AI 솔루션을 제공한다.
로크웰 AI 포트폴리오는 엣지단부터 IT단에 이르기까지 머신에 포커스한 부분에서 상위단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데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다.
머신을 포커스하는 FactoryTalk Analytics Logix AI나 FactoryTalk Analytics Guardian AI, FactoryTalk Analytics Vision AI가 있고, 턴키베이스로 수주를 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파빌리온8(Pavilion8)라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리고 데이터를 엣지단에서부터 상위단까지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데이터로 통합할 수 있는 씽웍스(ThingWorx)나 데이터모자익(FactoryTalk DataMosaix)과 같은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다.
로크웰의 AI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기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산업 자율제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 제품이다. 이제는 제조업에서의 AI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엣지 및 클라우드 기반 예지보전 및 품질향상 AI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 신경철 부장

로크웰 오토메이션 신경철 부장이 엣지 및 클라우드 기반 예지보전 및 품질향상 AI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백 팀장에 이어 로크웰 오토메이션 신경철 부장이 엣지 및 클라우드 기반 예지보전 및 품질향상 AI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신 부장은 Logix AI, Vision AI, Guardian AI 등 로크웰의 머신러닝 포트폴리오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Logix AI다. Anomaly Detect 위주로 만들어졌으며, 정상의 상태를 학습해서 비정상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예측모델이다. 운영 파라미터 조절을 위한 수동적인 실험값 또는 결과값을 논리적인 예측모델을 통해 대체한다.
훈련을 통해 상황과 훈련이 같은지 다른지 이상을 탐지하는 모델로, 훈련을 통해서 예측값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이 AI는 산업용 AI다. IT 레벨에 쓰고 있는 AI와 산업용 AI의 차이는, 산업용 AI는 쓰는 사람이 실무자라는 것이고 OT나 ET의 실무자가 직접 쓸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IT적 기술이 높지 않은 실무자들이 직접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는 의미다. 이 AI 모델이 하는 기능은 물리법칙을 기반으로 한 수학적 방정식을 생성하는 것이다(자동모델링 예시).
FactoryTalk Analytics LogixAI는 즉시 사용 가능하고, 코딩없는 머신러닝을 엣지에서 사용하므로 OT 직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LogixAI는 두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이다. 첫 번째는 Compute Module이다. 백플레인에 장착되고 이를 통해 Control Logix와 직접 통신하는 컴퓨트 모듈이다. 두 번째는 산업용 엣지 컴퓨터다. 컨테이너화된 App을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Control Logix와 통신하는 IPC 모듈이다.
두 번째 머신러닝 포트폴리오는 Guardian AI다, 예측정비 AI로, 상태기반 이상을 조기에 감지한다. 내장된 전문모델로 가장 발현빈도가 높은 결함은 즉시 감지되며, 사용자 지도학습으로 지속적인 기계학습이 가능하다.
모터에 대한 예지보전을 타깃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큰 특징은 센서가 필요없다는 점이다. 로크웰 PowerFlex 755시리즈 인버터가 AI 기능을 제공하면서 모터의 진동을 제어하거나 떨림을 제어하는 기능이 생겼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초당 1미리세크당 한 포인트 이상의 데이터를 캐치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 PowerFlex 755시리즈는 이 초당 4960개 포인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걸 프리에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하면, 이 안에서 모터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 외에 모터가 피드백 해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터의 이상유무를 예측하게 됐다. 고장이 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다. 또, 문제가 없으면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점검한 내용을 여기다 작성을 한다. 이것이 이게 Guardian AI의 주 목적이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는 Vision AI다. 비전 카메라를 통해, AI를 이용해서 품질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비전 카메라를 사용해서 품질을 체크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고, 지금도 SI나 많은 서드파티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로크웰에서 왜 런칭을 했을까?
보통 비전 카메라를 이용해서 품질관리를 하려면 전용 카메라가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투입돼야 되고, 이걸 파인튜닝을 해줘야 한다. 초기설치할 때 내손이 들어가지 않지만, 꾸준히 누군가의 서포트를 받아야만 쓸 수 있다. 로크웰이 비전AI를 런칭한 가장 큰 이유는 엔지니어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비전AI를 쓰면 핸들링하는 트리거 신호를 보내고, 카메라의 이더넷에 붙여서 쓰면, 바로 비전 카메라를 이용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서드파티나 전문가가 없이 내가 간단한 설정 정도만 해도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제품은 범용적인 부분을 커버한다. 더이상 포인트 솔루션을 건건이 들이는 게 아니고, 이걸로 60~70% 커버하고, 나머지 포인트 솔루션만 도입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총비용이 많이 감소가 된다. 또, 패키지화되어 있기 때문에 런칭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엣지단(현장단)에서 직접 판단을 하게 되어 있다. 단점 중의 하나가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엣지 레벨에서 학습을 할 수가 없다. 학습을 위해서 클라우드에서 컨트롤하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은 로크웰이 미국 보안에 대한 레벨을모두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만들고 대비를 하고 있다.

FactoryTalk Analytics VisionAI 품질검사 플랫폼
이어 Design Studio CoPilot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마이크로소프트가 ChatGPT 엔진을 받아다가 코파일럿으로 리브랜딩해서 자체적으로 런칭을 했는데, 로크웰은 제조업체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엔진을 받아다가 쓰는 유일한 업체다.
설비자동화 시스템에서 코파일럿을 이용한 시스템을 로크웰만 런칭하고 있는데, 경쟁사와의 차이는 로크웰 내부에 샌드박스를 구축해서 오픈AI 엔지니어가 와서 직접 설치를 다 해주고, 훈련을 할 수 있는 모든 소스는 로크웰이 가진 자산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점이다. 왜냐면 로크웰은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래더의 소스나 엔지니어링 자료나 널리지 베이스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비는 동작기기다. ChatGPT가 프로그램을 잘 짠다고 하지만, 파이선이나 C언어를 잘 짜주는 거지, 설비를 잘 동작시키는 건 다른 얘기다. 로크웰 코파일럿은 실무적이고, 현장적이나 동작적이나 여러 제약들을 다 감안해서 설계가 됐으며, 그리고 여기서 래더를 짜준다. 자연어로 “PID 제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면 “이 모듈을 쓰면 됩니다”라고 프롬프트로 다 나온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로크웰이 제공하는 코파일럿이다.
기존의 ChatGPT는 범용적인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겠지만, 설비동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데, 로크웰의 코파일럿은 이 부분을 커버다는 점이 차이다.
제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초연결성 및 초지능성 솔루션- 로크웰 오토메이션 김경진 부장
생산의 현지화라는 말은 10년 전에는 대기업들이 주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들도 생산의 현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과거 대기업들의 목표였던 시스템화, 리소스의 최소화, 중앙화, 그리고 협동,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의 향상, 이 모든 부분을 사실 중소기업들도 다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클라우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두가지 툴을 과거에 비해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현재 95%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 과거에는 IT에 집중이 되어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OT단에도 다 접목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로크웰은 클라우드 기반의 FT Design Hub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FT Design Hub 플랫폼
FactoryTalk DesignStudio는 PLC를 작화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FT OptixStudio는 HMI를 작화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FT TwinStudio는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서비스다. FTValut는 지적재산권이나 PLC에 대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서비스다. FT RemoteAccess는 원거리 제어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서비스다. FT DesignHub라는 플랫폼 안에 OT 그리고 생산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러닝되고 디플로이가 된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에서는 FT DesignStudio와 FT RemoteAccess 이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가 됐다.
FT DesignStudio는 PLC 관련, FT RemoteAccess는 원거리 관련 솔루션이다.
우선 FT DesignStudio에 대한 설명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장점은 여러 접속자가 동시에 공동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 접속은업무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 그리고 Integrated Version Control이 가능하다. 버전에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접속해서 무엇을 수정했는지 누가 작업을 했는지 알 수 있다. 또, Role-based Aess Controldl 가능해서 각각의 유저 따라 어떤 사람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니터링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역할 변환을 고려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외에 OT 기술이 접목이 되면 현대적 공정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
생성형 AI는 코드생성, 가이드 및 트러블 슈팅을 지원하며, C#이나 파이선같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적용된다. PLC 랭귀지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 PLC에 접속하는 사람들의 친밀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코드 표준화에 의한 반복작업이 최소화된다. 클라우드 기반이지만 생성형 AI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 생성을 하게 된다. 프로젝트를 국문으로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래더 코드나 언어기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고, 그 차단책이 뭔지를 가이드하게 된다.
다음은 FT Remote Access에 대한 설명이다.
FT Remote Access는 원거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공장 내 자산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다. 외부망을 통한 FT Remote Access를 통해 PLC나 PLC를 제어하는 PC에 접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이동을 줄이면서 네트워크 접근성이 향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객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데, 리모트 에어리어와 로컬 에어리어가 VPN 솔루션이기 때문에 IT 정책을 준수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공장 내에는 스트라틱스 4300 리모트 액세스 라우터가 들어가게 되고, 외부 리모트 에어리어에 있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FT Remote Accesss Software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 접속해서 공장 내에 있는 PLC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FT Design Studio와 FT Remote Access를 합쳐서 사용하게 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T Design Studio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오류를 잡고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리모트 에어리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리모트 액세스를 통해서 공장 내에 있는 하드웨어, 즉 로직스, MCC의 스테이스에 대한 관련자료, 관련 상태, 로직스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PLC 시뮬레이션 솔루션에 접속해서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다.
FT Design Studio를 리모트에서 작업을 하고 FT Remote Accesss로 VPN에 연결해서 리모트 에어리어, 로컬 에어리어를 연결하고 대상 컨트롤러 지정 후 프로젝트 적용, 다운로드하고, 모니터링하면 된다. PC에 소프트웨어를 까는 작업이 없다. 다만 어떤 PC를 갖고 퍼블릭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된다.

FT Design Studio와 FT Remote Access의 시너지 작업
Smart Connected Control Pannel Solution(EtherNet/IP in Cabinet). 제어 시스템 구성 및 판넬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커넥티드-로크웰 오토메이션 임호빈 차장
이어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임호빈 차장이 Smart Connected Control Pannel Solution(EtherNet/IP in Cabinet)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therNet/IP가 무엇이고, Smart Connected Control Pannel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기존의 산업용 패널은 매뉴얼 와이어링으로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선연결 테스트 기간이 오래 걸린다. 또, 결선을 하다 보면 오결선을 하거나 연결상태 불량의 가능성이 생긴다. 이로 인해 패널을 진행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시운전시간도 길어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EtherNet/IP in Cabinet 솔루션이다.
EtherNet/IP는 2001년에 도입된 제조자동화를 위한 대표적인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로 표준 이더넷 기술(IEEE802.3 및 TCP/IP)을 기반으로 한다. 2021년 ODVA는 EtherNet/IP를 캐비닛 내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발표했다. EtherNet/IP in Cabinet Solution은 ODVA 사양을 기반으로 캐비닛 내 적용에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제공한다.
식음료, 오일&가스 펄프&페이퍼, 자동차, 자재 핸들링 등 모든 자동화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EtherNet/IP in Cabinet Solution에는 1834 EtherNet/IP 게이트웨이 모듈이 필요하고, 이 게이트웨이 모듈을 통해서 원 케이블이 지나간다. 이것이 IBC IPC 패터를 통해서 각각의 컨택터 90와트 스위치에 연결되게 되어있다. 이 게이트웨이는 최대 25미터까지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의 게이트웨이 당 39개 구성품 연결이 가능하다. 한 개의 게이트웨이가 한 개의 IP를 갖고, 이 IP를 가지고 39개가 자동으로 IP가 부여가 된다.

EtherNet/IP in Cabinet Solution
PLC와 통신하는 게이트웨이만 한 개의 IP 소스를 갖고, 하위단의 구성품들은 갖지 않는다.
EtherNet/IP in Cabinet은 네트워크 전원 및 스위치 전원을 공급해서, 연결된 장치에 안정적인 전력을 제공한다. CIP 라우팅 및 I/O 집약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엔드노드의 자동 IP주소 설정기능으로 각각의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하위단 제품들의 ID를 지정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순서대로 자동으로 IP주소가 설정이 됨으로써, IP 주소가 할당이 되면 이것들을 하나씩 클릭클릭해서 시운전을 하게 된다.
1486 Flat Cable은 EtherNet/IP in Cabinet의 주요기술인데, 이 단일 케이블로 전원 공급 및 통신을 지원한다. 다중 도체 플랫 미디어는 버스 전원과 통신을 하나의 케이블로 처리하여 배선효율을 극대화한다. 네트워크 전원은 최대 4A, 스위치 전원은 최대 8A까지 가능하다.

1486 Flat Cable
로크웰에는 100-E라는 컨텍터와 104-E라는 통신 인터페이스가 있다. 기존의 컨넥터는 접점 코일을 이용해서 하드 와이어링해서 시그널을 받아서 온오프하는 제품인데, 이 컨넥터의 접점을 통신모듈을 통해서 접점의 횟수, 컨텍터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기존의 스마트 판넬 MCC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어있고, 통신이 되고 있다고 하겠지만, 기존의 100-E, 104-E라는 컨텍터를 사용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 근접 케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컨텍터와 EOCR을 통신에 연결할 수 있다.
800F라는 제품은 통신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와이어링으로 배선이 가는게 아니고, 플랫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하고, 카세트를 찍고 꽂으면 끝나는 솔루션이다. 지금 나와 있는 푸쉬버튼, 슬랙 스위치도 하드 외이어링이 아닌 플랫 케이블이라는 단일 케이블을 통해서 통신이 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제품들을 시운전하고 셋업하려면 별도의 툴을 사용해야 하나? 아니다.
Logix Designer 및 Studio 5000 Logix Designer를 그대로 이용해서, 게이트웨이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셋업, 시운전을 쉽게 할 수 있다. 로크웰 PLC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스터디해서 다른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 없이 기존의 로크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고, 로크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과 교육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배선시간 및 패널 사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고,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설계부터 배치까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고객은 패널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캐비닛 내 제품 및 리소스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Point-to-point 전기테스트 방법이 이더넷 연결로 대체되어 테스트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또, 프로젝트 전기설계시 배선의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글로벌 사례로 입증된 획기적인 시간절감 효과가 소개됐다.
볼가(Volga)라는 로크웰의 SI 파트너사는 EtherNet/IP in Cabinet Solution을 도입해서 패널 설계 및 배치과정 간소화. 배선시간, 테스트시간, 엔지니어링 시간 등에서 현저한 감소를 경험했다.
한편, 패널 크기를 줄이면, 환경 부담도 줄어든다. 패널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감소는 물론, 모듈형 설계와 확장성 덕분에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가 쉬워져, 전체 교체없이도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부품 낭비를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기 설계 단계에서 제어 배선을 단순화하면 전선, 케이블, 구리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소형 패널은 건설에 필요한 원자재가 적어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한다.
그렇다면 패널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전통적인 패널 배선 방식은 확장하고 싶어도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운영비용(시운전, 인력교육, 하드 와이어 구성품의 유지보수 및 문제해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고급 모니터링 기능이 부족해 문제식별과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그러나 Ethernet IP in Cabinet Solution은 작동횟수, EOCR을 통한 통신을 통해, 안의 전류치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Ethernet/IP in Cabinet Solution을 이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나? 예측유지보수 기능을 지원한다. 컨택터의 수명이 100만회라고 했을 때 컨택터가 예를 들어서 80만 회를 동작을 했다고 하면, 대비를 할 수 있다. 현재 한달에 컨택터 접점이 평균 10만 번으로 되어있는데, 컨택터가 가지고 있는 예상수명치가 끝나니까, 예방 예지보전을 위해서 컨택터를 준비하자고 해서 라인이 셧다운되기 전에 예지보전할 수 있는 예측 유지보수 기능이 제공된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AI Powered Network Security- Cisco 염윤정 프로

이어 시스코 염윤정 프로가 AI 시대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트워크를 통한 보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자사 솔루션과 함께 설명했다.
염 프로는 산업용 네트워크 실태 파악을 위해서 시스코에서 작년에 17개국, 20개 산업군에 걸쳐 1000명 이상의 OT 팀장급 이상 대상으로 현재 귀하의 조직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산업/OT 인프라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제조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부문은 첫 번째가 AI 지원 디바이스(31%), 두 번째가 사이버 보안 솔루션(3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재 “귀하의 조직은 기업이 직면한 장애물 및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첫 번째로 직원 역략 강화/재교육을 하겠다(42%)라는 답변이 나왔고, 이어 AI 도입이나 IT와 OT 협업 강화,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 증대, 사이버 보안 투자 증대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것은 제조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성장을 위해 단순히 기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도 동시에 투자하겠다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고, 특이사항은 84%가 선택하고 있는 밴더수를 줄일 생각이 전혀 없으며, 신기술이 도입되더라도 현재 플랫폼을 통합하거나 수를 줄일 생각이 없고 AI를 활용해서 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AI와 소프트웨어가 산업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나?
첫 번째는 머신비전(Machine Vision)인데, 제조공정의 공정라인이나, 품질공정, 검사장비에 비전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비전 카메라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PoE 옵션(4PoE) 에 대한 모듈들의 니즈가 많이 생기고 있고, 단순한 데이터 트래픽이 아니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기가에 이르는 대역폭을 지원해야 하는 네트워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공장에는 제어판넬이나 공간이 협소한 곳에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폼팩터로도 단말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제조업에도 자율주행이 무인지게차나 무인크레인, 이동형 사족보행 로봇, 드론 검사장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자율주행을 운영하기 위한 무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핸드폰을 위한 WiFi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WiFi나 산업용 무선 인프라가 중요하다. 산업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초저지연이 보장돼야 하고, 로밍이 빠르고 데이터 손실이 없어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다. 현장에서는 더이상 하드웨어를 현장에 두지 않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해서 가상화하겠다는 콘셉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도 밑받침이 되어야 하며, 로봇도 공장에서의 역할이 많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로봇이 오더만 받아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AI가 로봇을 제대로 프로그램해서 실시간으로 오더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든지 로봇에 대한 수급도 많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데이터 수집인데, 디지털 전환, AI하면서 AI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같이 있는 데이터가 방대하게 축적이 돼야 비로소 AI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때 현장에서 나오는 양질의 데이터를 잘 습득하기 위해서는 연결성이 확보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AI와 소프트웨어가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산업 AI를 실현할 때 핵심은 네트워크다.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화로 변화함에 있어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가상 로봇 컨트롤러나 가상 PLC나 RTU, 가상 컴퓨팅이 데이터센터 안에 구성이 되어있고, 브레인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학을 하게 되는데, 하단에는 실제로 가치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필드단이 있다. 로봇이나 이동체, 각종 센서들, 필드자산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과 상위의 브레인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주는 것이 네트워크다.

시스코는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 자동화와 산업 AI를 실현하는 핵심은 네트워크라고 강조한다.
시스코에서는 네트워크를 단순히 안정적인 연결을 하는 역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별성을 두고 보고 있다. 시스코에서는 대규모로 OT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시스코 네트워크를 가졌다면, 별도의 하드웨어나 망 구축이나 다른 부가작업 없이 이미 시스코 네트워크 솔루션에 내재된 가시화 솔루션, 보안 솔루션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OT 가시성도 네트워크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원격접속 제어도 할 수 있다. 또, 가시성을 기반으로 세그먼트를 통해서 IT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OT 네트워크도 세그먼테이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IT 네트워크와 동일하게 OT 네트워크도 세그먼테이션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코의 큰 장점이다.
이어 시스코의 산업용 IoT 포트폴리오 솔루션이 AI 시대나 보안이 중요한 시대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됐다.
운영의 단순화(Powered by AI), 확장가능한 디바이스(Ready for AI), 보안(Fused into the Network) 이 세가지를 핵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운영의 단순화는 현장의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과거에는 현장에 있는 네트워크는 관리요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OT 네트워크도 IT 네트워크처럼 관리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점점 복잡한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 시스코는 네트워크로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AI, 실시간 제어라든지 보안정책이 IT에서는 이미 최고수준에 달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시스코에서는 이런 IT 기술력을 OT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시스코의 산업용 제품군은 산업용 엣지 리더로 인정을 받고,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리더, OT 보안리더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다. IT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OT영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림10> 시스코는 IT 기술력을 OT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림10>의 왼쪽이 산업용 네트워크 포트롤리오다. 이것들이 다 AI 기반 네트워크에 필요한 고성능 산업용 스위치 제품들이고, 단순히 스위치 네트워크 제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 보안 솔루션도 가지고 있다.
공장의 고객 성향에 따라서 스스로 관리(온프라미스)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클라우드의 개방형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OT 네트워크의 관리 포인트들은 이미 IT에서는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기업에서는 IT와 OT를 같이 관리한다고 햇을 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스코에는 IT, OT 통합관리를 위해서 이미 IT에서 쓰고 있는 익숙한 카탈리스트 센터(Catalyst Center)라는 관리툴을 통해서 온프라미스로 관리할 수 있고, 또는 클라우드를 선호한다면, 머라키 대시보드(Meraki Dashboard)를 통해서 IT 네트워크와 OT 네트워크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온프라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다. 시스코는 산업용 시장에서도 똑같이 IT와 동일한 운영체계로 산업용 제품을 개발했고, 산업용이기 때문에 좀 더 혹독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보다 견고하고 콤팩트한 폼팩트로 만들어져 있다. 산업에서 사용이 되려면 각종 엔진이라든지 각종 산업용 프로토콜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갖춰진 산업에 특화된 제품군이다.
이미 IT 쪽에서의 기술력을 동일하게 OT 쪽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관리하면 스케일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복잡성은 감소돼서 단일화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OT, IT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관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산업용 스위치나 UPoE, 고성능을 지원해야 되고, AI 기반의 데이터 처리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시스코는 그런 제품군을 모두 가지고 있고, AI 기반의 모빌리티 무선사업을 할 때도 독자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은 보안(Fused into the network)이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내에 보안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망이나 하드웨어 없이도 보안을 가져갈 수 있다. 즉, 시큐어된 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시스코는 보안은 가시성에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시스코는 보안은 가시성에 시작된다고 보고 있다. 가시성이라고 하면 OT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트래픽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관리되고 있는 고객사를 보면 IT에서 레벨 3까지는 매니지드 네트워크로 매니지드 스위치로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OT 전체영역에서 봤을 때는 약 20% 정도의 가시성밖에 확보를 못한다. 하단의 수직적으로 플랫하게 트래픽이 오가는 이쪽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100% OT 영역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실 이쪽의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보통 스팬 포트 방식이나 하드웨어 장비를 따로 둬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는 복잡성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가시성 없이 보안 정책 도입이나 관리를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다운타임에 대한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시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가시성 기반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으로, 0부터 2레벨에서 네트워크 분석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는 시스코 사이버 비전(Cyber Vision) 센터를 통해서 래더센서에서 사이버 비전으로 데이터를 올려주면, 사이버 비전에 대한 가시성 데이터를 토대로 접속제어나 원격제어 같은 ISE 인증도 정책을 활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안 강화벽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가져가서 IT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사이버 비전은 시스코의 OT 전용 가시화 솔루션이다. 사이버 비전이라고 이미 시스코 산업용 네트워킹된 기능이고, 사이버 비전은 OT 쪽의 자산을 자동으로 탐지해서 자산 인벤토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다. 자산들이 어떻게 통신하고 있는지 패턴을 파악해주는 기술이고, 두 번째로는 시큐리티 포스처(Security Posture)라고 해서 보안에 대한 패턴을 파악해주는 기능이 있다. 각각의 파악된 장비별 취약점이라던지 취약점에 따른 리스크를 지표화해서 보안문제가 났을 때 어떤 것들을 먼저 개선해야 되는 지, 먼저 대응을 해야하는 지 지표를 줄 수 있는 기능이다. 세 번째로는 운영적으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는데, 프로세스나 장비가 변경이 됐을 때, 이벤트 기록이 나와서 사고가 났을 때, 추적을 해서 어떻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을지 백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솔루션이다.

가시성 기반의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산업 프로세스를 반영하도록 자산을 그룹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 수천 개의 자산이 있고, 수백만 개의 통신 흐름이 있고, 평면 네트워크 전반에 퍼지는 브로드캐스트 및 멀티 캐스트 트래픽이 있는데, 사람이 자산을 그룹화하기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사이버 비전의 AI 기술을 도입해서 AI 기반 클러스트링을 통해서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통신패턴이나 기능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깔끔하게 세그멘테이션해주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이버 비전에서 AI 기반으로 자동화 그룹을 해주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다보면 기업 전체 OT 보안 정책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AI 기반 클러스트링
최근 OT 네트워크 관리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공격도 많아지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 현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AI가 필수요건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AI도 AI 사용을 위해서 네트워크 현대화가 가속화 되고있는 실정이고, 기존에는 IT와 OT가 친하지 않고 최소화된 생활만 했다면, 이제는 유기적인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화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공장실현을 위해서 IT와 OT가 구분없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업들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미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한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가 쌓여서 그것들을 AI를 통해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 산업 네트워크의 변화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스코는 IT와 OT 전체 네트워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IT에서 가지고 있는 고급 관리능력을 OT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시스코의 목표이고, 창고나 물류센터, 주차장, 공장, 항만 등 무선이나 유선 네트워크가 필요한 곳에는 시스코의 시큐어 네트워킹 솔루션이 적용이 가능하다.
오토메이션에는 이기종 플랫폼으로 단일화되지 않은 것처럼, 네트워크나 운영체제, 보안 측면이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IT, OT의 컨소시엄이 중요해지는 AI 시대에 장벽이 되는 게 현실이다. 오토메이션 역할을 잘 하는 밴더사들의 역할을 그대로 두고, 시큐리티 네트워크를 통합해서 AI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통합적으로 시큐어드 네트워크를 가져가자는 것이 시스코의 비전이다. 염 프로는 시스코는 단순히 네트워크 하드웨어 컴포넌트 회사가 아니라, OT/IT 전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

시스코의 비전
염 프로에 이어 Smart Control Panels and Advance Panel Design을 주제로 한 리탈 코리아(Rittal Korea)의 발표와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가능케 하는 통신 솔루션을 주제로 한 Belden-Prosoft의 발표가 이어졌다.

다양한 환경의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을 가능케 하는 통신 솔루션을 주제로 한 Belden-Prosoft의 발표가 진행됐다.

Smart Control Panels and Advance Panel Design을 주제로 한 리탈 코리아(Rittal Korea)의 발표가 진행됐다.

행사장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