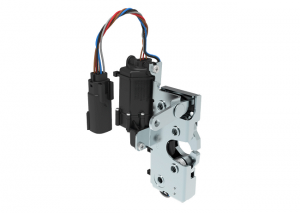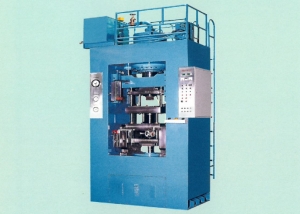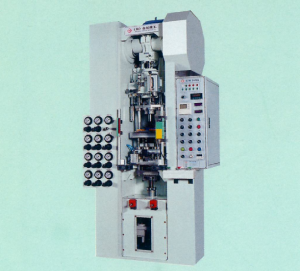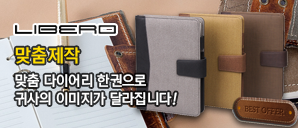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로봇 R&D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국은 자신들의 산업적 필요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위한 자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국의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 로봇 기술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국가들의 로봇 R&D 정책과 자금 지원 동향을 소개한다.

세계 제조로봇 전망(단위 : 백 만 달러) / 사진. 국제로봇연맹
1. 중국
중국의 산업용 로봇 개발은 1972년에 시작됐으며, ‘제7차 5개년 계획(1986~1990년)’ 기간에는 분사, 스폿 용접, 아크 용접, 운송 로봇에 대한 R&D가 본격화됐다. 1986년 시작된 ‘863 프로그램’은 로봇 관련 R&D에 막대한 정부 자금을 지원하면서, 중국 로봇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 됐다.
1990년대에는 용접 로봇이 9개의 산업화 허브와 7개의 R&D 센터에 집중 투자되며 주목을 받았고, 2015년부터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추진되면서 첨단 로봇과 정밀 기계 도구의 혁신이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이어진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서는 제조 혁신을 장려하고 AI를 로봇 개발에 통합하는 전략이 강화됐다.
같은 시기의 로봇 산업 발전 계획에서는 용접, 청소, 산업용 로봇 및 인간·기계 협력 분야를 중점 육성 대상으로 삼았다. 협력 분야에는 고정밀 감속기, 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개발이 포함됐다. 국가 과학기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능형 로봇 프로젝트(2017~2021년)’는 대규모 정부 자금의 지원을 받았고, 2020년에는 중국 과학기술부가 해당 프로그램에 913만 달러를 배정했다.
2022년에는 지능형 로봇 분야가 4,340만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향후 5년간 핵심 전략 산업으로 부상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발표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따라 로봇 산업이 8대 전략 산업 중 하나로 지정됐으며, 국가 과학기술 혁신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서 지능형 로봇 개발이 지속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4,540만 달러, 4,470만 달러의 예산이 지능형 로봇 분야에 배정됐으며, 2023년 기준 중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로봇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십 개의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미 세계 시장에 출시된 상태다.

국가별 제조로봇 시장 비중(단위 : 백 만 달러, %) / 사진. 국제로봇연맹
2. 일본
일본의 로봇 공학에 대한 국가 R&D 프로그램은 경제 활성화 정책과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의해 기획되며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서, 2014년에 발표된 ‘일본 부흥 전략 개정안’을 토대로 새로운 로봇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이 제시된 이후, 2016년 회계연도의 로봇 관련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2억 5,870만 달러로 편성됐으며, 2019년 회계연도에는 3억 3,260만 달러까지 확대됐다. 일본의 새로운 로봇 전략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제조, 서비스, 간호 및 의료, 인프라와 재해 대응, 건설, 농업·임업·어업 및 식품 산업 등 5개 부문에 걸쳐 실행 과제가 구체화됐다.
2019년에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문샷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1,76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배정됐으며, 이는 2018년의 8,800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보완하고, 인간과 함께 진화할 수 있는 AI 로봇 개발을 목표로 한다.
국립 연구개발 기관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이하 NEDO)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해 ‘로봇 공학 및 AI 기술 관련 프로젝트(2021~2022년)’를 시작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일상에도 전례 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21년에는 7,981만 달러, 2022년에는 6,748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돼 공급망 강화와 물류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산업용 로봇 및 자율주행 로봇 개발에 집중됐다.
2023년 12월, 일본 내각부는 문샷 연구개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융합 에너지의 다양한 응용을 통해 자원 제약이 없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10개의 문샷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신체, 뇌, 공간,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과 세 번째 목표인 ‘AI와 로봇의 공진화’는 로봇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로 분류된다. 경제산업성(METI)과 NEDO는 이와 연계해 2023년에 총 6억 4,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로봇 공학 R&D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2021년 기준 한국 로봇 시장(단위 : 억 원, %) /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3. 한국
한국의 로봇 산업은 정부와 산업계 간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초기에는 1978년 자동차 제조 분야에 용접 로봇이 도입되면서 정부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R&D가 이뤄졌다. 이후 1987년, 정부는 제조 로봇 개발을 위한 공통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국가 주도의 로봇 기술 진흥 정책의 출발점이 됐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정부의 자금 지원이 급감하면서 로봇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다.
2002년부터는 지능형 로봇 기술이 본격적으로 부상했고, 2003년을 기점으로 정부는 로봇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2007년까지 정부는 R&D와 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총 3억 4,550만 달러를 투자했고, 이어 2008년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해 이를 기반으로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09~2013년)’이 수립됐다. 이 계획은 제조 로봇 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 선도 기술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정부는 이들 분야에 총 5억 4,030만 달러를 투입해 기업의 매출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4~2018년)’은 재난 대응, 의료용 특수 서비스 로봇 등에 중점을 뒀으며, 로봇 기술과 제조업, 자동차 산업, 국방 분야 간 융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7,770만 달러를 편성했으며, 2018년에는 예산을 1억 2,050만 달러로 확대했다.
2023년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로봇 산업의 구체적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같은 해 국내 로봇 산업 시장을 107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로봇 전문 기업을 최소 20개 육성하며, 누적 기준으로 제조 현장에 가동 중인 로봇 수를 70만 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총 1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2024년 1월, 정부는 로봇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재확인하며, 제조 및 서비스 혁신을 견인할 핵심 기술로서 로봇 기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총 1억 2,8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 배정됐다.
4. 유럽연합
유럽연합(EU)은 1984년부터 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년간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이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하 FP)’으로 명명돼 FP1부터 FP7까지 이어졌다. 이후 FP8은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2014~2020년)’으로 대체되며, 기존 FP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광범위한 연구·혁신 과제를 포괄하게 됐다.
FP7(2007~2013년)은 특히 로봇공학 기술 개발에 중점을 뒀으며, 약 5억 6,510만 달러를 투입해 총 13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주요 지원 분야로는 인식, 행동·인지, 지능형 시스템 등이 포함됐고, 로봇공학 관련 기타 분야에도 별도로 1억 7,920만 달러의 자금이 배정됐다.
호라이즌 2020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및 신흥기술(FET), 사회적 과제 등 다양한 연구 테마를 포괄하는 대규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로봇공학 프로젝트는 제조, 의료, 운송, 농업 등 산업 전반에서 실행됐다. 전체적으로 약 7억 3,810만 달러가 로봇공학 R&D에 투입됐다.
호라이즌 2020은 3단계에 걸쳐 로봇공학 기술을 지원했다. 1단계(2014~2015년)에서는 산업 전반에서 로봇의 견고성, 유연성, 자율성 향상을 목표로 36개 프로젝트에 약 1억 6,560만 달러를 지원했다. 2단계(2016~2017년)에서는 인간-로봇 상호작용, 내비게이션 기술 등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실제 응용으로 이어지는 기술 전환을 강조하며 약 1억 2,760만 달러가 배정됐다. 3단계(2018~2020년)는 AI와 인지 기술을 로봇공학에 접목해 인간-로봇 협업을 통한 산업 디지털화를 추진했고, 약 1억 6,450만 달러가 투입됐다.
후속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2021~2027년)’은 호라이즌 2020을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환경 인식, 디지털 정교함, 건강한 미래를 위한 연구·혁신을 핵심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전략적 연구·혁신·개발 의제는 인공지능, 데이터, 로봇공학의 발전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로봇공학은 ‘클러스터 4 : 디지털, 산업 및 우주(이하 클러스터 4)’에 포함돼 있으며, 해당 세부 정책은 2024년 4월 발표됐다.
클러스터 4는 제조 및 건설 부문의 디지털 전환, 인간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율 솔루션, 인지 능력 향상 및 디지털 기술 발전, AI 및 데이터 공유, 첨단 로봇공학 기반의 인간-로봇 협업 등 핵심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현재 클러스터 4 내 로봇공학 관련 프로젝트에는 총 1억 8,350만 달러의 자금이 배정돼 있다.
한편, 유럽우주국(ESA)은 2024년 3월 위성 기술과 자율 로봇 시스템의 통합을 통한 상업적 응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타당성 조사 및 시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례별 최대 53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5. 미국
2020년 미국이 운영한 로봇공학 R&D 프로그램은 ▲우주 로봇공학 ▲군사 로봇공학 및 자율 시스템 ▲유비쿼터스 협업 로봇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됐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미국 내 대표적인 우주 로봇공학 R&D 기관으로, '화성 탐사 프로그램(Mars Exploration Program, 이하 MEP)'을 통해 화성 탐사 임무를 지속했다. 이 프로그램은 NASA의 예산 지원을 받아 장기적으로 화성을 탐사하는 미션이며, 21세기 초에는 물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됐다. 이후 MEP의 초점은 화성의 기후와 지질 특성 분석으로 옮겨졌다.
2013년 9월, NASA는 ‘Sample Caching System’을 포함한 탐사 장비를 제안·개발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로버인 ‘Opportunity’를 발사했다. MEP 장비는 2013년에 설정된 과학 목표에 따라 공모를 거쳐 2014년 7월에 선정됐으며, 이후 ‘Mars 2020’ 프로그램이 출범해 2020년 7월 로버가 발사됐다. 이 로버는 2021년 2월 화성의 ‘Jezero 분화구’에 착륙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거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추가 과학 장비를 탑재했다.
이후 NASA는 MEP에 이어 2019년 5월, 달 탐사 프로그램인 ‘Artemis’를 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우주비행사를 달에 보내고, 이후 화성 유인 탐사를 위한 기반 기술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Artemis는 1단계(2020~2024년)와 2단계(2025~2029년)로 구성된다. 1단계는 달 착륙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며, Artemis I(무인 비행 시험), Artemis II(유인 달 궤도 비행), Artemis III(유인 달 착륙)의 세 가지 주요 임무를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극지방의 휘발성 물질 및 지질 연구, 자기 측정 임무 등이 수행될 계획이었다. 2단계는 달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간 거주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외에도 미국 국방부는 무인 군사 시스템과 로봇 차량 개발 관련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국방장관의 ‘RDE Focus’ 발표 이후 자율성은 국방부 과학기술의 핵심 우선순위 중 하나로 부상했다. 국방부는 매년 자율 군사 차량 개발 및 부대 통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에는 센서 및 페이로드, 항법·제어, 무기 시스템, 통신 및 데이터 관리, 자율 기능, 추진 및 에너지 시스템, 이동성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는 2019년 자율 시스템 분야에 약 9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해군·육군·공군 등 주요 군 조직과 관련 기관에 자금이 분배됐다. 2021년에는 75억 4,000만 달러, 2022년에는 82억 달러, 2023년에는 약 103억 달러가 로봇 및 자율 기술에 각각 편성됐다.
기초 로봇 공학 연구를 위한 ‘국립 로봇 공학 이니셔티브(National Robotics Initiative, 이하 NRI)’는 2011년에 출범했으며, 이후 NRI-1.0에서 NRI-2.0, NRI-3.0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했다. NRI-1.0은 인간과 협력하는 협동로봇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2016년에 도입된 NRI-2.0은 유비쿼터스 협동로봇을 지향하며 보다 통합된 기술 및 시스템 연구에 중점을 뒀다. 2019년에는 연방 정부의 여러 기관을 통해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기초 및 통합 연구가 지원됐고, 2020년에는 3,200만 달러가 편성됐다.
같은 해에는 로봇을 통한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 인간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미국 국립 로봇 공학 로드맵 2020’이 발표됐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은 ‘지능형 로봇 및 자율 시스템(Intelligent 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이하 IRAS)’ 관련 R&D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했다. 이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설계, 기계 인식, 적응 및 학습, 이동성과 조작, 인간-로봇 상호작용, 분산 로봇 및 자율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한다.
IRAS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간-로봇 협업 ▲로봇 및 자율 시스템의 검증 및 신뢰성 향상 ▲지능형 물리 시스템의 고도화다. 2021년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에서 IRAS가 차지한 예산은 총 65억 달러로, 이 해 미국은 IRAS의 일환으로 NRI-3.0을 출범시켰다. NRI-3.0은 안전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인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로봇 공학 R&D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로봇 연구 커뮤니티 강화, 혁신 유도, 새로운 기능 시연, 통합 기능 및 신뢰성 확보 등의 포괄적인 과제를 내세웠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2022년 5월, 12년간 총 3억 달러를 투자해 300개 이상의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한 뒤 NRI-3.0의 종료를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