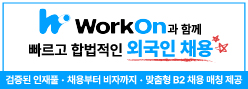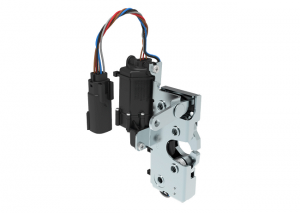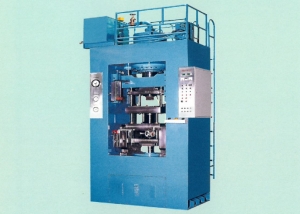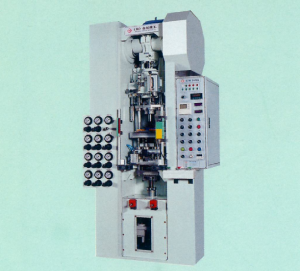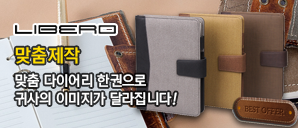Special Report Rising Sun, Catch The Energy
태양광 활용
태양이 머무는 건물 ‘BIPV’ 주목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가운데 시장규모가 큰 것이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이다. 때문에 건설사를 중심으로 BIP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파이크리서치(Pike Research)는 2016년 세계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 시장이 40억달러(한화 약 4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전망과 함께 국내도 BIPV 시장에 대한 업계의 눈길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파이크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세계 BIPV 및 BAPV(건물적용태양광발전시스템) 설비용량은 215MW에 불과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세를 나타내며 2016년까지 2.4GW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했다.
보고서는 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등 고효율 전지 시장진입과 결정지 및 박막 실리콘에 의한 BIPV 디자인개발을 이유로 들었다.
BIPV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건축자재에 이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자체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올해도 태양광산업이 호조를 보이자 관련 산업이 BIPV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는 높은 비용 때문에 민간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SK케미칼 사옥과 같이 사업용 시공 사례가 늘고 있어 세계시장 전망이 국내에서도 실현될지 기대를 높여준다.
이러한 기대는 국내 역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SK케미칼 사옥을 설계한 이건창호 관계자는 건축시장이 살아나면 건축과 밀접하게 연결된 BIPV로선 낙관적이다 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모듈 가격 역시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돼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가 앞당겨지면 민간시장 형성도 가능하다. 그리드패리티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시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업계 역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색상적용이 가능한 DSSC(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이나 차세대 전지를 연구해, 개인 사용자들이 효율을 떠나 디자인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시기를 준비하는 기업도 있다. 또한 설치공법 및 자재연구를 통해 BIPV 효율을 최적화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2009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유망사업으로 인식되며 각 대학에서도 BIPV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인력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
CSP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
|
2011년 기가와트 규모의 도입을 앞둔 CSP(집광형 태양력)가 이제 본격 빛을 보기 시작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광전지 가격과 환경 및 금전적 문제가 있지만 CSP(집광형 태양력) 기술이 2011년 기가와트 도입을 앞두고 있다.
“태양열 업데이트: CSP의 르네상스”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세 가지 주요 CSP 기술(파라볼릭 트로프, 파워 타워 및 스털링 열 시스템)의 경제성과 성과뿐 아니라 CSP의 주요 경쟁자, 광전지 시스템을 비교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에는 가상의 100MW 발전소에서 각 기술의 적용을 연구하고,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자본 비용, 내부 수익률 및 도입에 원동력이 되는 기타 요소들이 비교했다. “몇 번의 중단과 진전 후, 태양열 프로젝트는 스페인과 미국 남서부의 발전 혼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Lux Research 수석 분석자이자 보고서의 리드 작성자 Ted Sullivan은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트로프 기술이 대세였지만 파워 타워 기술이 입증되면서 이 기술이 더욱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열 저장 기술과의 통합은 지금까지 태양열을 방해해 왔던 근본적인 제한 요소, 간헐성을 해결했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의 트로프 및 타워 CSP 기술은 성능 면에서 앞선다. 파라볼릭 트로프 발전소는 피크 효율성이 가장 높지만 생산량과 생산 능력 요인에서는 2위이다. 하지만 파워 타워는 효율성이 높은 터빈 사이클과 이중축 트래킹에 의한 시스템 생산량과 생산 능력 요인에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이와 달리, 접시형 스털링과 PV는 낮은 생산 능력 요인과 낮은 에너지 생산량으로, 피크 파워의 킬로와트당 킬로와트-시간 생산량(kWh/kWp)에서 성과가 낮았다.
■ 접시형 스털링은 LCOE에서도 앞선다. LCOE(단위: $/kWh)가 발전소의 총 운영비를 간단히 통합하고, 프로젝트 투자자에게 IRR(내부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접시형 스털링은 낮은 비용과 우수한 성능면에서 PV의 훌륭한 대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파워 타워 기술이 이 뒤를 바짝 쫓고 있고 앞으로 수년 동안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에 비해 파라볼릭 트로프 시스템은 비싼 자본적 지출로 인해 CSP 발전소 중 LCOE가 가장 높고 운전 및 정비 비용도 높다. PV 시스템은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적 지출과 중간 정도 수준의 성능 때문에 LCOE 면에서 다른 경쟁 상대를 따라가고 있다.
|